지금 생각해도 참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눕자마자 잠들었고, 잠을 잤는지도 모를 만큼 산뜻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1958년은 내 삶의 이른 봄이었고 새싹처럼 파릇파릇하게 자라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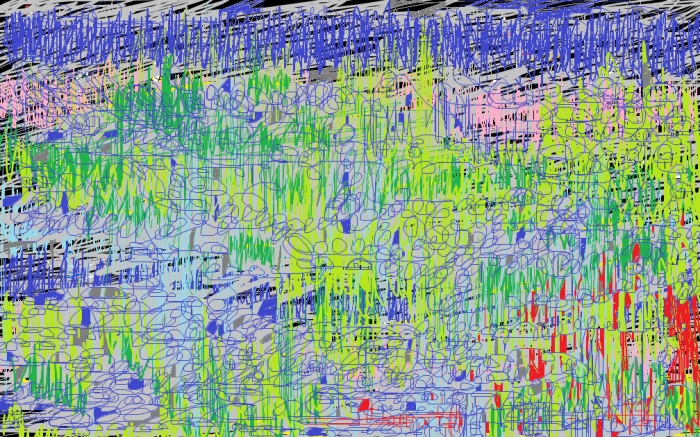
아버지는 2019년 현재 94세이지만 내가 다섯 살이었던 1958년에는 서른셋이었다. 서른셋의 내가 그랬듯이 아버지도 두루 원만한 성격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 때 서른한 살이었는데 이미 세 아이를 낳았다.
내가 다섯 살, 아우는 세살, 그리고 한 번 울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젖먹이였던 여동생까지 세 아이(막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를 길렀던 어머니는 아버지 병원의 유일한 간호사이기도 했다. 물론 간호사 자격증은 없었다.
우리 형제는 경쟁이 심하여 놀면서도 싸웠으니 그 행태가 두 마리 강아지 같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다. 어지르고, 깨고, 쏟고, 놀리고, 도망가고, 쫒고, 숨고, 일러바치고, 매 맞고, 울고, 울다가 금방 헤헤 웃고는 다시 뛰어 노는 개구쟁이들이었다.
한 때는 양산을 든 여성들의 하늘하늘한 주름치마를 들추고 그 속에 머리를 디미는 놀이도 곧잘 하였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그러다 매를 맞아도 또 그런 놀이를 하였다.
그 때, 그러니까 다섯 살에,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다. 소꿉놀이를 하며 같이 자란 이웃집 여자 애가 취학 적령기가 되어 학교에 가게 되자 나도 학교에 가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어머니가 학교에 통사정을 해서 입학 시켰던 것이다.
왼쪽 가슴에 손수건과 명찰을 달고, 흰 말이 그려진 가죽 책가방을 메고, 어머니가 만들어 준 신주머니를 들고, 새댁이었던 숙모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면서 길가에 늘어선 점포들의 간판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철원 상회, 연백 쌀집, 황해 여인숙, 기쁜 소리사, 제일 편물, 낙동강, 양지다방, 새나라 사진관, 평안 상회, 일동 철물, 낙동강, 평양냉면 …….
등교 길에 숙모가 읽어 주는 대로 따라 하다가 어느덧 혼자 읽게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지금은 다섯 살에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지만 그 시절에는 다섯 살에 동네 가게 간판을 읽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다. 꽤나 똑똑한 애들 축에 들었던 것이다.
뜀박질도 잘했다. 아무리 뛰어도 숨찬 줄 몰랐고 땀이 나지 않았다. 다섯 살이었지만 키도 작지 않아서 두어 살 씩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학교를 다녔고, 동네 조무래기들의 대장이었던 Y 도 나에게는 특별대우를 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눕자마자 잠들었고, 잠을 잤는지도 모를 만큼 산뜻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1958년은 내 삶의 이른 봄이었고, 내가 새싹처럼 파릇파릇하게 자라던 때였다.
그때 우리는 전쟁놀이를 즐겼다. 국도 건너편의 극장 동네 조무래기들이 한 패를 이루었고, 시장 동네의 조무래기들이 또 한 패를 이루었으며, 우리는 버스 종점 조무래기들이 모인 패거리였다.
아이들이 창이나 칼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무기'는 남의 집 싸리울에서 뽑은 싸리가지나 빈 집 창틀에서 뜯어낸 얇은 무늬목이었다. 우리는 러닝셔츠나 스웨터를 벗어 머리에 두건처럼 쓰고서 무기를 쳐들고 와와 소리 지르며 열광하였다. 때로는 쫒고 때로는 쫓기었다. 쫒기다 넘어져서 무르팍이 깨지기도 했다.
우리 동네 군사들이 극장 동네 군사들과 국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였다. Y 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극장 동네 대장에게 휴전을 제의하려고 국도를 건너갔다. 극장 동네 대장은 Y 보다도 더 큰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내가 휴전을 제의하자 ‘쪼그만 게 까분다’며 발길질을 해댔다. 나는 그 발길질을 피해 국도를 건너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국도를 달리던 지프차에 치어 머리가 터졌던 것이다.
지서 순경이 마침 현장에 있었다 한다. 그는 의식을 잃고 피를 철철 흘리는 아이를 안고 길가의 병원에 뛰어 들어갔다. 병원의 의사부부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얼굴의 피를 알코올을 적신 거즈로 씻겨내고 보니 당신들 자식이었다.
아버지가 대노하여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나는 잠시 깨어났다. 아버지는 ‘당장 내다 버리라’고 고함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에게 매달려 통사정 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소리요, 어쨌거나 빨리 손을 써서 애부터 살려 놓고 볼 일이요.’
나는 가물가물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마조마하게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큰 고함을 질렀다.
‘내다 버리라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아득해졌다.
부산 육군병원의 문관이었을 때의 아버지는 수술실 조수로 일했다. 아버지가 수술을 도왔던 외과 의사 중에는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손상에 관한 전문의도 있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아버지는 옛날 시골 개인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을 마쳤다. 아버지는 ‘의사로써 최선을 다 했으니 아들이 살고 죽는 것은 이제 아들놈 팔자소관’이라고 말했다 한다.
내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며칠 후였다고 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어른들의 얼굴이 맨 먼저 보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과 과자와 통조림들이 보였다. 좀 더 회복된 후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내 머리에는 석고 붕대가 단단하게 둘러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권투 선수들이 쓰는 투구 같았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아버지는 헌병대에서 온 군수사관에게 각서를 써 주고 사고를 낸 지프차 운전병을 석방해 줄 것을 탄원했다고 한다. 각서의 내용은, 갑자기 길에 뛰어든 내 자식이 잘못이다. 내 자식이 비록 깨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군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운전병을 즉시 석방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나는 내가 다쳤을 때 아버지가 고함 친 일에 대해 두어 번 어머니에게 물은 일이 있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 또 소설 쓰는구나. 언제 아버지가 너를 죽게 내다 버리라고 했냐. 나를 야단쳤던 거지. 뭘 하느라고 애가 길에 나가 차에 치도록 내버려 뒀냐고 어미인 나를 혼낸 거지. 생각해 봐라. 제 자식이 차에 치여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너를 죽게 내 버리라고 했겠냐.”
나는 내 기억이 확실하다고 말 할 생각이 없다. 또한 그 기억이 확실하더라도 아버지를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그 사고는 내 뒤통수에 도끼에 찍힌 듯한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수술대에 누워서 들었던 아버지의 고함 소리도 뺨을 타고 주르르 흐르던 눈물의 기억과 함께 상처를 남겼다.
내 잘못으로 차에 치었고, 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나는 그 때부터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우선 말을 더듬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심하게 더듬었으며 때로는 식은땀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은연중 아버지를 피하려고 들었다.
내가 말을 더듬으면 아버지는 따따버버리(말더듬이라는 뜻)라고 퉁망을 주었다. 동생들은 내 흉내를 내며 재미있어 했다. 집요하게 말더듬이가 된 형 흉내를 내던 아우도 얼마 후 형처럼 말더듬이가 되기도 했다. ★

